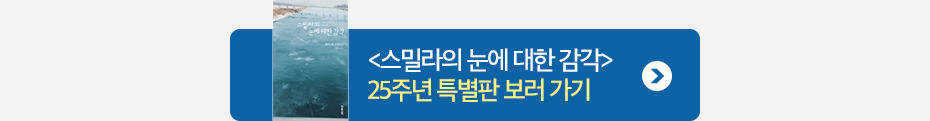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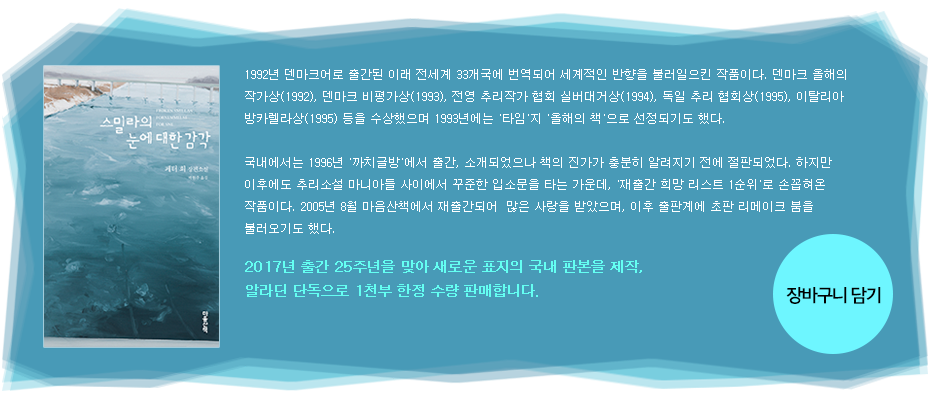



195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다. 1984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작가가 되기 전까지 발레 무용수, 배우, 선원, 펜싱 선수, 등산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처녀작인 <덴마크 꿈의 역사 Forestilling om det Tyvende arhundrede>(1988)와 단편집 <밤의 이야기 Fortællinger om natten>(1990)를 출간한 뒤, 1993년 발표한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1997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듬해 발표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 De maske egnede>과 1996년에 발표한 <여자와 원숭이 Kvinden og aben> 이후 10년 만에 <콰이어트 걸>을 발표했다. 현재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코펜하겐에 살고 있다.
이듬해 발표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 De maske egnede>과 1996년에 발표한 <여자와 원숭이 Kvinden og aben> 이후 10년 만에 <콰이어트 걸>을 발표했다. 현재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코펜하겐에 살고 있다.

소설 번역 작업을 할 때면 그 속의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장 안에 주어진 단서에 따라 그를 상상하고 구축한다. 그 인물이 말할 때의 표정, 걸음걸이, 눈빛 등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살아 있는 사람보다도 더 생생해진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모든 인물이 원고가 끝나고 완성된 책이 나온 이후에도 계속 옆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와 붙어 살기에는 내가 있는 현실 세상이 너무 좁고 번잡하며, 새 작업을 할 때마다 인구가 늘어 어느샌가 폭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한 책이 끝날 때마다 그 주인공을 놓아줄 수밖에 없다. 잘 가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하지만 서로 낯선 사람이 되진 말아요. 또 만나요.
그러나 가끔은 그렇게 떠나가지 않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한번 삶에 들어온 이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을 만난 후에는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 바쁜 하루 중에 문득 골똘하게 생각에 빠질 때, 길을 걸을 때, 어떤 장면을 볼 때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거는 것 같은 주인공이 있다. 스밀라 카비아크 야스페르센도 그렇게 옆에 남아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그가 세상에 나온 지 2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내가 그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긴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령 이런 때다.
늦은 저녁, 세상의 모든 집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풍경을 볼 때 게오르크 칸토어와 무한 호텔의 비유를 떠올린다. 세상에 우리 모두를 받아줄 방이 있다는 생각은 스밀라가 알려준 질서다. 어느 오후,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며 책을 읽을 때 문득 스밀라와 이사야가 함께 유클리드를 읽던 시간을 상상한다. 삶에서 드문 평화는 말없이도 타인과 공감할 수 있을 때라는 걸 깨닫는다. 프랙털 형태의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스밀라처럼 여러 눈의 이름을 발음해본다. 세계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걸 실감한다. 녹아가는 빙하와 굶어 죽는 북극곰, 그에 대한 문명의 책임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스밀라가 그리워했던 그린란드의 삶을 그려본다. 비극적이게도 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면 그 이유를 기어이 알아내려 했던, 그리하여 저 먼 얼음의 나라까지 갔던 스밀라의 의지가 사무친다. 아이들의 죽음은 설명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스밀라는 아직도 이 세계 속의 사람처럼 느껴진다. [전문보기]
그러나 가끔은 그렇게 떠나가지 않는 인물이 있다. 그들은 한번 삶에 들어온 이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을 만난 후에는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 바쁜 하루 중에 문득 골똘하게 생각에 빠질 때, 길을 걸을 때, 어떤 장면을 볼 때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거는 것 같은 주인공이 있다. 스밀라 카비아크 야스페르센도 그렇게 옆에 남아 있는 사람 중 하나다. 그가 세상에 나온 지 2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내가 그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긴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령 이런 때다.
늦은 저녁, 세상의 모든 집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풍경을 볼 때 게오르크 칸토어와 무한 호텔의 비유를 떠올린다. 세상에 우리 모두를 받아줄 방이 있다는 생각은 스밀라가 알려준 질서다. 어느 오후,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며 책을 읽을 때 문득 스밀라와 이사야가 함께 유클리드를 읽던 시간을 상상한다. 삶에서 드문 평화는 말없이도 타인과 공감할 수 있을 때라는 걸 깨닫는다. 프랙털 형태의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스밀라처럼 여러 눈의 이름을 발음해본다. 세계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이 있다는 걸 실감한다. 녹아가는 빙하와 굶어 죽는 북극곰, 그에 대한 문명의 책임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스밀라가 그리워했던 그린란드의 삶을 그려본다. 비극적이게도 아이들의 죽음을 볼 때면 그 이유를 기어이 알아내려 했던, 그리하여 저 먼 얼음의 나라까지 갔던 스밀라의 의지가 사무친다. 아이들의 죽음은 설명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렇게 스밀라는 아직도 이 세계 속의 사람처럼 느껴진다. [전문보기]
스밀라. 그녀는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다. 매력이란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스밀라가 내게 보여주는 세상은 구름과 눈과 얼음의 세계다. 음악처럼 언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스밀라는 내게 보여준다. 나는 스밀라가 보여주는 세계를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그럴 때, 나 역시 스밀라처럼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몇몇의 순간의 나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아마도 이 책을 펼친 당신 역시 그렇지 않겠는가.
도그지어(dog's ear)라는 건 개의 귀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건 문자를, 그리고 문자로 표현되는 세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예의바른 행동이다. 도그지어라는 건 책장의 한쪽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접어놓는 일을 뜻한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 순간을 그렇게 접어놓는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접어놓은 삼각형들을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밀라를 읽는 일은 그 일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이해한다는 뜻이다.
스밀라의 세계로 초대받는 자들이 결국 알게 되는 것들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그토록 깊은 이해다. 인간이란, 이 세계란, 도대체 우리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세계를 둘러싼 음모나 투쟁 따위는 스밀라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점뿐이다. 자신이 읽은 눈(雪)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이의 죽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스밀라는 길을 떠난다. 그 사소한 죽음을 납득하기 위해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북극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차가운 여자'에게 입이라도 맞춰줄 것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도 나처럼 스밀라에게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행자의 숙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파트에 돌아와 이 우주에 크레머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만큼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스밀라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영하 40도에서도 얼어붙지 않는 구름 속의 물방울들처럼 역경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말하는 스밀라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아는 세상에서는 없다. [전문보기]
도그지어(dog's ear)라는 건 개의 귀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건 문자를, 그리고 문자로 표현되는 세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예의바른 행동이다. 도그지어라는 건 책장의 한쪽 귀퉁이를 삼각형으로 접어놓는 일을 뜻한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 순간을 그렇게 접어놓는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접어놓은 삼각형들을 책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밀라를 읽는 일은 그 일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이해한다는 뜻이다.
스밀라의 세계로 초대받는 자들이 결국 알게 되는 것들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그토록 깊은 이해다. 인간이란, 이 세계란, 도대체 우리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 세계를 둘러싼 음모나 투쟁 따위는 스밀라에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점뿐이다. 자신이 읽은 눈(雪)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이의 죽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스밀라는 길을 떠난다. 그 사소한 죽음을 납득하기 위해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북극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차가운 여자'에게 입이라도 맞춰줄 것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도 나처럼 스밀라에게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행자의 숙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파트에 돌아와 이 우주에 크레머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만큼 아름다운 것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스밀라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영하 40도에서도 얼어붙지 않는 구름 속의 물방울들처럼 역경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싶다고 말하는 스밀라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아는 세상에서는 없다. [전문보기]




사실 따지면 아주 간단한 스토리다. 한 아이가 죽고, 그 아이와 친분이 있던 스밀라라는 여인이 그 아이의 죽음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그 아이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여인은 그 음모를 밝히기 위해 거대한 모험 속으로 거침없이 빠져들고, 결국, 해결한다.
그러나 우리는 소설을 스토리 하나 때문에 읽지는 않는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는 그 하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의 장치이고 부분요소일 뿐이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는 전부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집합이고, 남은 여집합은 무한대의 무게와 깊이, 그리고 여운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에 있었다. 그 무엇은, 바로 독자가 찾아야 한다. 인물들을 통해, 문장을 통해, 소설 내적 장면과 상황과 독자의 상상력을 총 동원해. 그래야만 이 소설에 대한 전부를 끌어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소설이든, 작가의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작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나의 편독을 전제할지라도) 이 소설은 내 협소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데 충분하다 못해 넘칠 지경이었다. 추위와 눈과 얼음의 땅, 스밀라가 가지고 있는 야생성, 스밀라가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소설 속에 잘 아우러 표현한 작가적 역량에 대해서 나는 극찬을 감히 하고 싶다. 소설 읽기의 즐거움, 내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만나게 했던 소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소설 군데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문장들과 담론들(그래서 도그지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즐거움도 이 소설의 즐거움일 것이다. [전문보기]
그러나 우리는 소설을 스토리 하나 때문에 읽지는 않는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는 그 하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의 장치이고 부분요소일 뿐이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는 전부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집합이고, 남은 여집합은 무한대의 무게와 깊이, 그리고 여운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에 있었다. 그 무엇은, 바로 독자가 찾아야 한다. 인물들을 통해, 문장을 통해, 소설 내적 장면과 상황과 독자의 상상력을 총 동원해. 그래야만 이 소설에 대한 전부를 끌어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소설이든, 작가의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작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나의 편독을 전제할지라도) 이 소설은 내 협소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데 충분하다 못해 넘칠 지경이었다. 추위와 눈과 얼음의 땅, 스밀라가 가지고 있는 야생성, 스밀라가 세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소설 속에 잘 아우러 표현한 작가적 역량에 대해서 나는 극찬을 감히 하고 싶다. 소설 읽기의 즐거움, 내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만나게 했던 소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소설 군데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문장들과 담론들(그래서 도그지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즐거움도 이 소설의 즐거움일 것이다. [전문보기]

솔직히 이 소설은 쉬운 소설이 아닐 수 있다. 소설이 말하고 있는 바를 난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자연과 문명의 대립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추악한 범죄와 광기가 빚어낸 잔인과 살인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밀라의 사유, 몇몇 장면에서의 스밀라의 대사와 독설, 정체하는 것을 모르는 스밀라가 생동감 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밀라는 사람을 그야말로 흡인하는 것이다. 소설은 고요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띈다.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곳곳에 자리한 문학적으로 뛰어난 공들인 묘사가 돋보여서 인상깊은 작품이었다.
고독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스밀라. 눈송이가 흩날리고 얼어붙은 얼음을 보면 이젠 스밀라가 떠오를 것 같다. 사실 덴마크는 알아도 그린란드라는 지명은 내겐 낯설었다.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도 적지 않고. 좀 부대끼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한 소년의 죽음에 깃든 음모와 비밀을 파헤쳐 가는 매혹적인 스밀라를 내 뇌리에서 잊게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 말에 자신있다. [전문보기]
고독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스밀라. 눈송이가 흩날리고 얼어붙은 얼음을 보면 이젠 스밀라가 떠오를 것 같다. 사실 덴마크는 알아도 그린란드라는 지명은 내겐 낯설었다.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도 적지 않고. 좀 부대끼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한 소년의 죽음에 깃든 음모와 비밀을 파헤쳐 가는 매혹적인 스밀라를 내 뇌리에서 잊게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 말에 자신있다. [전문보기]